The Dog Days of Summer
- Joy Woudenberg
- Aug 26, 2025
- 14 min read
We call this time of year the dog days of summer. Characterized by sweltering hot days that seem to drag by and make you feel tired and lazy, but that has been far from my experience this summer.
Hello and welcome to the Joyful Journey. If this is your first time joining me here, welcome! If you’re interested in reading up on the rest of the Journey, you can find those blogs here.
Just for a refresher for any of my new readers, I’m Joy and I quit my corporate job back in August of 2024 to come to South Korea and teach English. I’ve been recording my experiences in a series of blogs I’ve named The Joyful Journey.
My last update to you rolled out early May and now we’re closing in on the end of August, the end of summer, and the end of an era. I’ve got lots of ground to cover so let’s get started.
Our First and Last Summer
If you are coming to Korea in the summer I must warn you about something no one seems to talk about when vacationing to East Asia.
It’s hot here too. Like so hot. Like hot in the way that sometimes you shake a little with the heat. And the humidity will have you sweating in a way that seems humanly impossible.
Never in my life have I felt sweat running down my back after only walking a few meters, but the subway station is only two blocks from my house and by the time I get underground my back is wet and my bangs are plastered to my face with sweat.
Last summer I arrived in mid-August, so I can recall this heat, at least a little bit, so I was better prepared. But if it’s your first time in Korea, maybe save the visit for after October or before June.
If you must come to Korea at this time I recommend you come to Busan, because it seems to be the best of evils in this sweltering heat. At least there is a refreshing ocean to swim in. Or if you must die of heat stroke you can enjoy the mountain views in your last moments.
Before Summer Break
The thing about school in Korea is that it is a flipped schedule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So instead of a long summer break of three months and maybe three weeks in the winter, we have three months in the winter and three weeks in the summer. That means that the semester drags on into the heat of summer.
My two schools didn’t break for summer until at least mid-July. But for whatever reason the final exams were completed the second to last week of June. That means three weeks of what most people refer to as “free semester.” No scheduled textbook lessons, no planned curriculum. Just 45 minutes of class time to kill.
But I happen to be an expert time waster. Trust me, if there's a chance for me to dilly I’m gonna take it and dally too. I practically majored in goofing off. However, keeping a room full of middle school boys entertained in a slightly educational way for 45 whole minutes without any planned curriculum is no easy task.
That is why I am forever in debt to the Native English teachers who have come before me for inventing such fun games and sharing them online. My classes’ favorites are called “Scene-It Games.” This is a game in which the students are shown a music video of any kind then they must remember details and answer questions later.
Unfortunately, one by one classroom air conditioning units began to break until it felt like every day an announcement was being made that a class had to be moved to a different location. Each time I went to a class it was like a scavenger hunt to see where they had been relocated.
I kept my weekends during these quasi-summer days filled as well; diligently crossing things off of my ‘Korean Summer Bucket List.’ One of the most notable of those things being the infamous Waterbomb.
Really this event is just a water-themed festival in which various Korean artists perform and the crowd brings water guns to spray them as they fight back with hoses from the stage. It’s really fun and somewhat reminiscent of Songkran.
One thing I didn’t know going into that event was the way in which it was regarded by the general public. To me, who has seen the event on social media for years now, it seemed like a simple water-park-like event, nothing nefarious.
But whenever I told someone I would be going to the event, I was met with reactions of scandalization. Apparently, to the conservative South Korean general public, an event in which most people were dressed in swimming attire was a bit risqué. Just another one of those cultural differences you’d never think of until you experience it.
In my opinion, there was nothing illicit about the event besides being a bit waterboarded from the constant splash of water. It was a great way to cool off from the sweltering heat and see some very famous artists all at once!
Other than Waterbomb, of course I had to see my favorite K-pop group, ATEEZ, when they had a concert in Seoul. That was my 6th time seeing them and they never disappoint.
During Summer Break
For most teachers, summer break is a reward for tireless work. For Native English teachers, it’s English Camp: five days, twenty hours, and a whole curriculum to design from scratch. Not for the faint of heart.
Luckily, I had the wisdom of former teachers who shared their lessons online. I borrowed and tweaked, and somehow came up with a camp. My camp theme was “Around the World in 5 Days.” Korea, Mexico, Thailand, Kenya, and New Zealand. We made piñatas, tried Muay Thai kicks, jumped like the Maasai, and floated mini Loy Krathong lanterns.
Attendance was optional, but thanks to some marketing (and bribing the students with the promise of food), I had four times more kids than winter camp. Seeing them actually show up during their vacation? A definite win for Miss Joy.
Miss Joy’s Break
After two weeks of English camp, it was finally my turn for a break; ten precious days off. I set off on my adventure to a place I’ve already been three times this year: Bangkok, Thailand.
What can I say, I love Bangkok. My friend and I treated ourselves to some much-needed beauty treatments, wandered the mega malls, and even found ourselves on a river cruise.
Something about Bangkok always draws me back.
One of my happy places is on the back of a Grab bike, weaving through rush hour traffic in the sweltering heat, somehow grinning the whole time.
After a few days in the city, we flew south to Phuket and immediately booked a tour to the Phi Phi Islands. You know those travel agency posters with impossibly turquoise water and cliffs jutting out of the sea? That’s Phi Phi, and it was every bit as unreal in person.
We swam on white sand beaches, snorkeled among bright fish, and even spotted juvenile sharks gliding beneath us. It felt like stepping into a movie.
Of course, no trip is perfect and I feel a responsibility to my dear readers to report the entirety of the experience, not just the good parts. After the islands, we both got hit with food poisoning; every traveler’s nightmare.
For me, with my notoriously sensitive stomach, recovery was slow and it put a damper on the food side of things. But it didn’t ruin the trip. I can hang, even with a tummy ache. So onward we went to our last stop: Hong Kong.
Hong Kong was unlike anywhere I’ve been. The city felt frozen in the 1950s with neon lights, red cabs, and double-decker buses, yet alive with crowds and color in a way that never felt sterile. What struck me most was the multiculturalism; groups of friends from different backgrounds just existing together in a way I haven’t often seen in East Asia.
The history is everywhere too — not just British and Chinese influence, but the memory of Kowloon Walled City, which still lingers in the massive housing blocks where laundry waves from every window.
The streets hum with markets, food stalls, and the constant drip of AC units overhead. My friend and I joked we were “getting baptized by the city.”
At the same time, you can feel the shift of China moving back in, almost like the city is changing under your feet. It made the whole experience feel fleeting, like I was catching Hong Kong in one of its last versions.
But after ten days of traveling, the highs, the lows, the sunburns, and the memories, I was ready to get back to my own bed in Busan.
After Summer Break
The time before and after my summer break was filled with goodbyes. That is just the nature of being an immigrant worker I suppose. Our contract ended August 25th. My friends and I had to make the call of staying or going. And while some of us decided to stay, others decided to go.
So my weekends were booked. Instead of firsts, these were our lasts. Our last time getting barbecue together, our last time going to the beach, our last slumber party. While of course these aren’t the last times we will see each other, this is indeed the end of a season in our lives. Something that can never be returned to.
But that’s something we’ve known all along. Maybe that’s why each experience has seemed to shine so brightly and burn itself so clearly in our memory. Although we never talked of it at length, we all knew these moments were fleeting.
I’m sure at one point your mother turned to you and said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only constant in life is change.” And despite hearing it our entire lives, why do we still find ourselves tight-lipped and white-knuckled as we stare at impending change closing in on us?
I can’t help but mourn this change like a little death, for this past year can never be recreated, nor should it be as its fleetingness is what made it so sweet.
Staying or Going
In late August 2024 last year, a group of strangers descended on the campus of a university in Jeonju, South Korea without a clue about what their lives for the next year would look like.
From confusing bank visits, to guessing what menus said, getting lost in subway stations and missing our moms. We did it all together.
Me and the other Native English teachers in Busan got very close. How could we not? Who better to understand your experience than someon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I recently learned a Korean word that captures this feeling perfectly: 전우애 (jeon-u-ae). It literally means “comradeship in arms,” but it’s used to describe the deep bond that forms when people go through something challenging together.
And while opening a bank account, fumbling through ordering fried chicken, or crying through homesickness isn’t exactly combat, it sure felt like it sometimes. What made it bearable was having my friends beside me.
전우애 was cramming into photo booths for the hundredth time, belting Mamma Mia at noraebang, raging about unfair hierarchies over somaek, or just knowing someone else understood that bone-deep ache of living abroad. That bond is what made this year unforgettable.
But a year together marks the completion of the one-year contract and now the decision to stay in Korea or return to our home country settles on all of us like an invisible weight.
There are two ways to look at life here in Korea.
The first makes Korea feel like a different world,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lives we led back home. Not moving forward, not going back, just paused in time. Almost like a break from the reality of one’s early adulthood. Cherishing it but chalking it up to experience instead of progress.
The second is the start of something new. Seeing life here in Korea as a culmination of the events of our lives back home. Using this job to step forward or maybe diagonally towards life’s goals and aspirations.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your time here, your answer to staying or going is easily decided. As you may have guessed at this point, I’ve decided to stay here in Korea for another year. So that must mean I’m moving towards something, right?
I’d like to think yes. And while I can’t tell you exactly where I’m going, I know deep in my heart that my future doesn’t lie back in the United States. Well, at least in my near future.
Trust me I have no delusions that this upcoming year will be the same as this past year. Novelty wears off, things become tiring, and probably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will be the absence of many of the friends who’ve become so dear to me.
But at the same time I cannot ignore the voice inside me telling me I’m not done here. Telling me that if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ind my job sincerely enjoyable, I shouldn’t be so quick to give that up. Furthermore, I feel I’m on the cusp of a breakthrough with my language ability and it’s never been in my nature to throw in the towel early.
So while my heart is breaking saying goodbye to my friends and really goodbye to a period of my life, I remain steadfast in my decision to stay and it is my decision after all. No matter what lies ahead, I know I can weather the storms and bask in the sun.
(항상 그렇듯, The Joyful Journey의 번역은 ChatGPT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제가 최대한 확인하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오류나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맘때를 영어로는 dog days of summer라고 부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나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시기라는 뜻인데요, 제 이번 여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The Joyful Journey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글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새 독자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자면, 저는 조이라고 합니다. 2024년 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들을 The Joyful Journey라는 블로그 시리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데이트는 5월 초에 올렸는데, 벌써 8월 말, 여름의 끝, 그리고 하나의 시대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름
혹시 여름에 한국을 오실 예정이라면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여행 온다고 하면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는 사실인데요—한국도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몸이 떨릴 정도예요. 그리고 습도 때문에 사람이 땀을 도대체 이렇게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흘리게 됩니다.
저는 단 몇 미터만 걸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경험을 한국에 와서 처음 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두 블록밖에 안 되는데, 도착하면 이미 등에 땀이 차고 앞머리가 땀에 붙어버려요.
작년 여름엔 8월 중순에 도착해서 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10월 이후나 6월 이전에 오시길 추천합니다.
굳이 이 시기에 한국에 오셔야 한다면 부산을 추천드려요. 이 끔찍한 더위 속에서도 그나마 나은 선택지 같습니다. 적어도 시원하게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열사병으로 쓰러지더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방학 전
한국 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학사 일정이에요. 미국은 여름 방학이 세 달, 겨울 방학이 세 주 정도라면, 한국은 겨울 방학이 세 달, 여름 방학이 세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기가 한여름 무더위 속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가 다니는 두 학교도 7월 중순쯤이 돼서야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말고사는 6월 둘째 주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세 주 동안은 소위 말하는 ‘자유학기’가 된 셈이죠. 교과서 수업도, 정해진 커리큘럼도 없이, 그냥 45분의 수업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시간 때우기의 달인입니다. 빈둥거릴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무조건 잡거든요. 저는 거의 “놀고먹기 전공자”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준비된 커리큘럼도 없이 중학생 남자애들 한 교실을 45분 동안 약간은 교육적인 방식으로(!) 즐겁게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이런 재밌는 수업 게임들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유해주신 원어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해요. 제 수업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Scene-It 게임”인데요, 학생들이 뮤직비디오를 본 후에 세부 내용을 기억해 나중에 퀴즈로 맞히는 방식입니다.
그 무렵 교실 에어컨은 하나둘씩 고장 나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어느 반이 교실을 옮겨야 한다”는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찾아다니는 게 거의 보물찾기 같았어요.
주말에는 이런 ‘준여름방학’ 동안 한국 여름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열심히 지워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악명 높은 워터밤(Waterbomb)이었죠.
사실 이건 물 축제에 가깝습니다. 여러 한국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물총을 가져와서 무대를 향해 물을 쏘면, 무대에서는 호스로 반격하는 식이에요. 태국의 송끄란을 떠올리게 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재밌는 축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들에게 간다고 말했더니 반응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노는 이 축제가 꽤 ‘과감한 행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 못 했던 문화 차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계속 물을 맞아서 살짝 고문당하는 기분(?) 말고는요. 그 덕분에 더위를 잊을 수 있었고, 유명 아티스트들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니 완전 최고였죠!
물론 워터밤만 간 건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K-POP 그룹인 에이티즈(ATEEZ)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콘서트가 제 여섯 번째였는데, 역시나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에게 여름방학은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원어민 영어 선생님에게 여름방학은… 바로 영어 캠프죠. 5일간, 20시간, 그리고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는 커리큘럼. 마음 약한 사람은 감히 시도도 못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전 선생님들이 온라인에 공유해주신 수업 자료 덕분에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조금 빌리고,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해서 캠프를 완성했습니다. 제 캠프 주제는 “5일 동안 세계 여행”. 한국, 멕시코, 태국, 케냐, 뉴질랜드를 테마로 했습니다. 피냐타를 만들고, 무에타이 발차기를 해보고, 마사이처럼 뛰고, 작은 로이크라통 등을 띄우기도 했죠.
참여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조금의 마케팅(그리고 음식으로 학생들을 유혹한 덕분)에 겨우, 겨울 캠프보다 4배나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실제로 와준 것만으로도 조이 선생님의 승리였습니다.
조이 선생님의 휴식
영어 캠프 2주가 끝나고, 드디어 저의 차례! 소중한 10일간의 휴식을 즐기러 떠났습니다. 올해 이미 세 번이나 다녀온 곳, 태국 방콕으로요.
뭐라 말해야 할까요, 방콕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친구와 함께 꼭 필요한 뷰티 트리트먼트를 받고, 대형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리버 크루즈까지 즐겼죠.
방콕에는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제 행복한 장소 중 하나는 Grab 바이크 뒷자석에 앉아, 한여름 교통 체증 속을 헤집고 다니며, 어쩐지 계속 웃고 있는 순간입니다.
도시에서 몇 날을 보내고, 남쪽 푸켓으로 날아가 곧바로 피피섬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여행사 포스터에서 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터쿼이즈빛 바다와 바다 위로 쭉 뻗은 절벽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피피섬이고, 실제로도 똑같이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하얀 모래사장에서 수영하고, 화려한 물고기 사이에서 스노클링하고, 어린 상어들이 물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영화 속 장면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여행이 완벽할 수는 없죠. 제 소중한 독자분들께 솔직하게 말하자면, 섬 여행 후 둘 다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여행자의 악몽 중 하나죠.
저처럼 민감한 위를 가진 사람은 회복이 더디고, 음식 즐기는 재미가 반쯤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여행 자체를 망치진 못했습니다. 배가 아파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홍콩은 제가 가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도시는 1950년대에 멈춘 듯한 느낌, 네온사인, 빨간 택시, 2층 버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색으로 가득 찬 활기가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그냥 함께 있는 모습, 동아시아에서 흔히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역사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구룡성(九龙城) 기억까지, 커다란 아파트 블록마다 창문에서 빨래가 펄럭이는 모습 속에 살아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장과 음식 포장마차가 계속 움직이고, 위에서는 에어컨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친구와 저는 농담 삼아 “도시에서 세례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죠.
한편,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확장하는 느낌도 느껴집니다. 마치 발 아래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전체 경험이 덧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홍콩의 마지막 버전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10일간 여행하며, 즐거운 순간과 힘든 순간, 햇볕에 탄 피부와 기억까지, 이제 저는 부산의 내 침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여름방학 전후의 시간은 작별인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민 노동자의 삶이라는 거겠죠. 저희 계약은 8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남을지 떠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부는 남기로, 일부는 떠나기로 했죠.
그래서 주말은 예약 완료였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바비큐를 먹고,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가고, 마지막으로 슬럼버 파티를 즐기는 시간. 물론, 서로를 다시 만날 기회는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한 시즌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각 경험이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기억 속에 또렷하게 새겨진 것일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이 덧없음을 알고 있었죠.
분명 어느 순간,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건 오직 변화뿐.” 평생 들어온 말이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말없이, 손에 힘을 주고 임박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이 변화를 작은 죽음처럼 애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은 다시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덧없음이 바로 이 시간을 달콤하게 만든 이유니까요.
남을까, 떠날까
2024년 8월 말, 전주 한 대학 캠퍼스에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죠.
은행에서 길을 헤매고, 메뉴를 읽어보며 추측하고,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함께 겪었죠.
부산의 다른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과 저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당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 말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한국어 단어가 이 느낌을 완벽히 담고 있어요: 전우애(jeon-u-ae). 직역하면 “동지애” 정도 되지만,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생기는 깊은 유대감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은행 계좌를 열고, 치킨 주문을 실수하고, 향수병으로 울어도, 전쟁은 아니지만 때로는 전쟁 같았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우애는 수차례 포토부스에 함께 끼어들고, 노래방에서 맘마미아를 소리 질러 부르고, 소맥 마시며 불공평한 위계에 분노하고, 단지 누군가가 해외 생활의 뼛속까지 아픈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 그 유대감이 올해를 잊을 수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1년 계약이 끝났고, 이제 한국에 남을지, 본국으로 돌아갈지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전혀 다른 세계, 집에서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마치 초기 성인기로부터 잠시 벗어난 휴식처럼요. 소중히 여기지만, 단순한 경험으로 남기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집에서의 경험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는 것. 이 일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선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을지 떠날지 답은 쉽게 결정됩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1년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미래가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요.
이번 1년이 지난 1년과 똑같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은 사라지고, 피곤해지고, 아마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소중했던 많은 친구들이 없다는 점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발견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목소리, 그리고 언어 실력에서 터닝포인트 직전이라는 느낌. 포기하는 것은 제 성격상 아니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삶의 한 시절과 진정으로 작별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에 남겠다는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든, 폭풍을 견디고 햇살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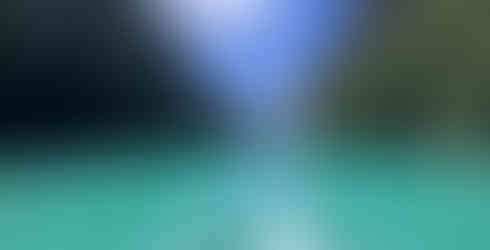





















































오,,, 한국말 잘하네,, 번역기가 아니라면 정말 놀라울 정도군... 새로운 1년이 작년 1년보다 더 뜻 깊은 일년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